‘정명(靖明)’은 조선시대 종묘제례악에 포함된 궁중음악의 한 곡으로, 조선 태종의 비인 원경왕후 민씨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명’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안정시키고(靖), 밝게 한다(明)’는 의미를 지니며,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원경왕후가 보여준 지혜롭고 능동적인 내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민요 ‘쌍화점’에서 유래한 선율
흥미롭게도 정명의 선율은 고려시대의 대표 민요 ‘쌍화점’에서 유래했습니다.
쌍화점은 남녀 간의 금기된 사랑을 다룬 솔직하고 대중적인 가요로, 고려시대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렸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이고 민중적인 선율이, 왕실의 제례악으로 편곡되어 계승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왜 민간 노래를 궁중 제례에 사용했을까
조선 왕실이 민요의 선율을 궁중음악에 끌어들인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민간에서 널리 퍼진 선율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정서적으로 친숙한 음악은 왕실 의례에서도 감정적 울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기존 가사를 걷어내고 새로운 가사를 붙임으로써, 음악의 공적 의미와 위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율 차용과 가사 개작의 전통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시경, 서양의 그레고리안 성가 등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명, 단순한 음악 그 이상
정명은 단지 음악을 넘어 민간과 궁정, 일상과 의례, 감성과 권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쌍화점이라는 민중의 사랑 노래가 왕실의 제례악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한국 음악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날 종묘제례악으로 전해지는 정명은, 고려의 선율이 조선 왕조 속에서 다시 태어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명은 민중의 멜로디에 왕실의 상징성을 덧입힌 살아 있는 음악적 기록입니다.
이 한 곡의 흐름을 통해 고려와 조선, 백성과 왕실, 세속과 성스러움이 한 선율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은 단지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전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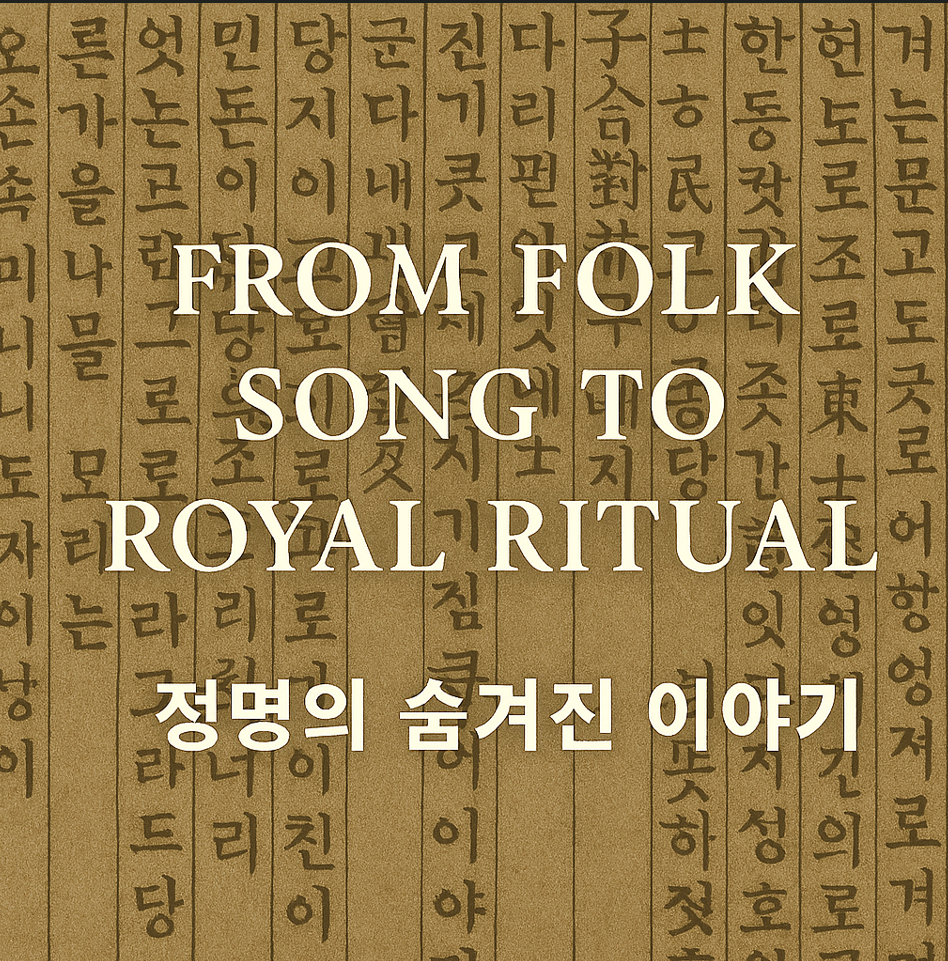
'이야기 >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악학궤범』 – 조선 전통음악의 살아있는 교과서 (3) | 2025.08.02 |
|---|---|
| 감성을 표현하는 소리, 농현과 요성 (1) | 2025.07.20 |
| 소리뿐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하다, 국악 악현배치 해석하기 (2) | 2025.07.18 |
| 거문고의 유래와 전승 (6) | 2025.06.30 |
| 세종대왕과 박연의 국악 이야기 (5) | 2025.06.24 |



